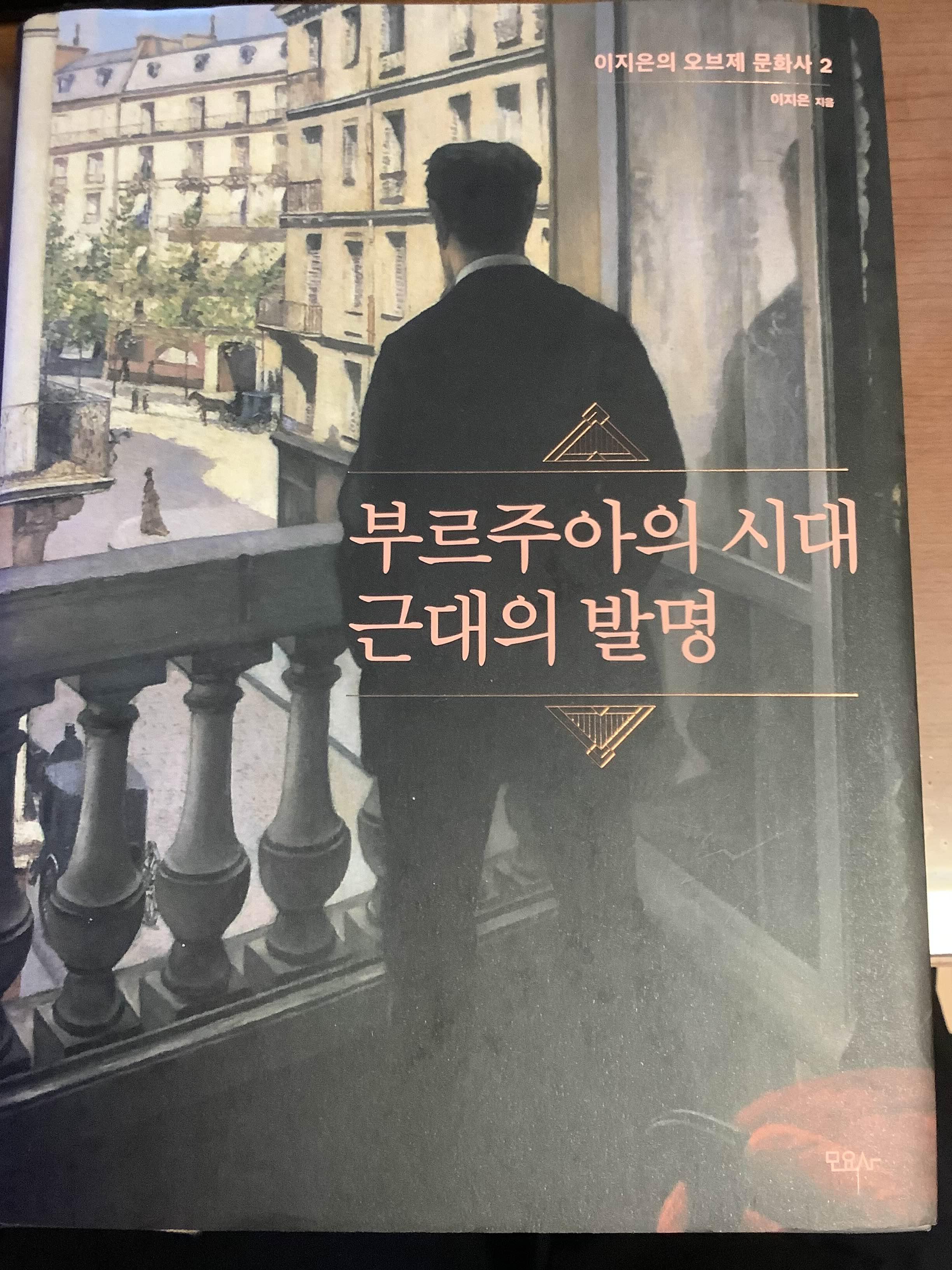
이지은 | 모요사 | 2023.6.9~16
꽤 오래 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던 책인데 내가 이 책을 알았을 때는 절판이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말도 안 되서 그냥 포기하고 잊었다. 그런데 재판됐다는 소식에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또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구입해서 아주 즐겁게 읽었다.
일단 이 책의 저자가 밝혔듯이 도판이 아주 풍부하다. 보통 이런 류의 책을 보면 늘 보던 그림이 또 나와서 식상한데 여기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다양해서 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풍족하다는 느낌이랄까, 행복했다.
내용은 왜 절판이 되고도 사람들이 재판 요청열 열심히 하고 절판본이 비싸게 팔렸는지 알 것 같은 깊이와 재미가 있다. 이런 류의 책은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모아놓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사전 같거나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데, 저자가 살았고 공부했던 파리라는 도시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활 미술, 혹은 산업 디자인을 통해 19세기 유럽 사회를 세밀하게 파헤쳐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서순의 유럽 문화사와 겹쳐지는 부분도 떠올리며 읽는 즐거움이 정말 쏠쏠했다.
백화점을 다룬 장에서 카탈로그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빙그레. 내가 중학교 때던가, 길에서 헌책을 파는 아저씨에게 거의 전화번호부 수준으로 두꺼운 미국 카탈로그를 산적이 있었다. 아마 크리스마스용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저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상상하고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간직했었다. 어른이 되면서 직구가 없던 시절에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나 동생, 혹은 친구를 통해서 정말 갖고 싶었던 걸 하나둘씩 샀을 때 그 짜릿함은 그 모든 게 흔해진 지금과는 다른 만족도. 특히 향수 페이지에서 보고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았던 화이트 숄더라는 향수는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백화점에서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사서 잘 썼다.
아마 어린 시절 내가 가졌던 동경을 19세기 카탈로그를 보던 사람들도 가졌겠지. 그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설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VIP, VVIP용 카탈로그도 따로 있었단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발전은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중. ㅎㅎ 옛날 LG 홈쇼핑 시절에 부친이 뭔가 거기서 한번 엄청 많이 쓰신 적이 있어서 한 두어달 VIP 카탈로그가 왔는데 제품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일반용과 차원이 달랐다. 아마 봉마셰니 쁘랭탕의 카탈로그도 그랬겠지.
1900년 만국 박람회 때 우리가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참여했다는 기록과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 바로 5년 뒤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고 1910년에는 나라를 뺏겼겠구나. 좋은 자리를 차지해 넓고 화려해 북적거리는 일본관을 바라보면서 당시 박람회에 참여했던 조선, 아니 대한제국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오말 공작이 평생동안 모은 어마어마한 컬렉션이 남아 있는 샹티이 성은 몇년 전 가족여행 때 들렀는데 눈에 익은 공간과 그림이 보이니 왠지 더 친숙~
다만 좀 의아했던 건, 아리타의 도자기 공방들이 1879년부터 전기 가마를 사용하는 등 서양의 기술력을 도입했다고 써있는데 그 시기에 일본에 전기가 들어왔던가??? 내 기억에 (이건 전기 관련 다큐멘터리를 기획해봐서 꽤 정확한데) 동북아시아 3국 중에 전기를 가장 먼저 도입한 건 한국, 당시엔 조선. 전기도, 전화도 전차도 일본보다 우리가 빨랐는데... 😥 이건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할듯.
여튼, 다음에 파리에 가면 니심 드 카몽도 박물관에 꼭 가봐야겠다는 메모를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떠올리게 한 독서를 마무리.
좋은 글은 다층적인 생각과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책은 거기에 부합. 이 시리즈의 1권에 해당하는 귀족의 시대, 탐미의 발견도 조만간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다.



